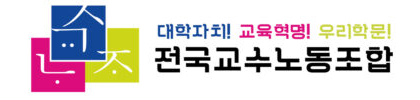기관사 아내의 일기
일반
작성자
유균
작성일
2004-11-09 22:00
조회
1970
기관사 아내의 일기
저의 남편은 아침저녁 밤낮 구분 없이 일을 하는 철도 기관사인데요. 두 달이 채 못 되어 사고를 두 번 냈지 뭐예요. 한번은 만취한 어느 실직자였는데 서울역을 눈앞에 두고 달리는데 검은 그림자의 사내가 비틀대며 걸어오더랍니다. 막차를 몰고 자정이 넘어 '이제 끝나 쉴 수 있겠구나' 하며 여유 있게 역으로 들어오던 참인데, 그런데요. 기차길 한가운데로 비틀대며 걸어오던 사람이 비켜서지를 않더랍니다.
어쩌겠습니까. 쇠 바퀴로 받고 달려갈 수 밖에요. 기차란 게 그런 거랍니다. 브레이크를 잡아도 쉽게 멈출 줄 모르고, 차에 한번 받쳤다하면 사람이고 뭣이고 성할 수가 없다나 봐요. 오죽했겠어요. 그것도 자살할 마음으로 기차에 덤벼들었으니.
또 한번은 영등포를 출발하여 새벽기차를 몰고 가던 참이었는데요. 안개가 자욱했던 날이었었나 봐요. 새벽 6시가 좀 못되었는데 안개까지 끼어 정신을 놓을 수가 없었던 그날은 머리가 쭈뼛쭈뼛 솟고, 식은땀이 속옷을 적실 정도로 긴장이 되더랍니다. 왜 아니겠어요. 며칠 전에도 그 끔찍한 사상사고를 냈고 직접 시체를 치우고 뒤틀리고, 잘려나간 가슴의 주머니를 뒤져 신분을 확인하는 일까지 손수 마쳐야 했으니 밥도 제대로 못 먹던 때였는데요.
그런데 그 날은 새벽일을 하기 위해 기찻길을 가로질러 건너가던 공사장 인부였었나 봐요. 그 사람은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게 그만 기차길 중간에서 한발자국도 못 움직인 채 기차 속으로 묻혀 들어가 피범벅이 되었더랍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지만 기관사실 안에서 "야 야 임마 비켜! 한 발짝만 비켜서란 말야" 하고 소리친들 들렸겠습니까? 급히 차를 정차해놓고 내려가 보니 한 50미터는 쇠 바퀴에 깔렸더랍니다.
온몸이 조각나 얼굴이 어디고 다리가 어딘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처참했다지 뭐예요. 겨우 주머니를 뒤져 신분을 확인해 보니 58년 생 두 아이의 가장이더랍니다. 서른아홉 살인 남편은 다시 기관차를 몰고 목적지로 행했는데 정말 더러운 게 인생이더랍니다. 남편은 이 짓을 더 해야 되냐며 울부짖었습니다. 다시는 이 두 손으로 시체를 치우고 싶지 않다며 손을 부르르 떨었지요. 밤새 술을 푸고 뻘겋게 충혈 된 눈으로 다시 출근해 기차를 몰고 다시 울부짖고… 몇 날을 그렇게 보냈지요.
IMF, IMF 해도 우리 집은 그나마 일자리가 있어 다행이라고 여기며 지내왔지만 더 이상 남편을 일터로 나가라고 할 수가 없었지요. '설마 굶어 죽기야 하겠냐 싶어 몸 좀 추스린 다음 영 안 되면 시골에 내려가자'며 달랬습니다. 저는 남편이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았어요. 저러다가 정신이 돌아버리는 건 아닌가, 어떤 기관사는 사고 후유증으로 며칠을 아무 말 없이 지내다가 넥타이로 목을 매 자살을 했다는데, 오랜 동기인 어떤 기관사는 아직도 정신병원에 있다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뭐예요.
남편으로 인해 숨져간 사람들을 생각할 틈도 없이 하루하루 버티는 남편을 바라보는 것도 힘들고 벅찼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일밖에 모르며 살아온 남편인데, 나이 마흔도 안 되어 닥친 시련을 어찌해야 되나 절망스러웠지만 어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같이 술을 마셔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매만져 주고…
결혼 10년에 처음으로 부부란 게 이런 건가 싶데요. 내가 아니면 누가 저 고통을 나눌 수 있겠나 싶기도 하구요.
그 동안 10년 가까이 기관사 일로 밤낮없이 출근하고, 한겨울이 되면 무쇠덩이의 기관차가 꽁꽁 얼어붙어 손이 쩍쩍 달라붙고 콧물을 흘리면 콧물이 고드름으로 변해 고드름을 코에 매달고 달리고, 삼십 도를 오르내리는 한여름이 되면 기관차는 사 오십 도도 넘어 기관차에 달걀 후라이를 해먹어도 될 정도로 뜨거운 기관차 안에서 여름을 보내고 소금기에 절은 속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일하며 사우나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기관사실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며 웃기도 하던 남편이었지요.
어떤 때는 대소변을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 달리는 기관차 안에서 해결하기도 하고 제때에 밥을 못 먹어 늘 가방에는 소화제니, 위장약을 과자처럼 넣고 다니지만 여태껏 일해 온 나날이 두 번의 사고가 사람을 하루아침에 절망 속으로 빠뜨리는구나 생각하니 화병이 날 것만 같았지요.
며칠을 말 한마디 없이 지내던 남편이 한번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녀석을 위해서라도 기관사일을 멈출 수 없다'며 웃음을 짓지 뭐예요. 기관사보다 대통령이 더 좋은 사람이라며 놀려도 여태껏 변함없이 기관사가 꿈인 아들한테만큼은 멋진 기관사 아빠이고 싶다며 애를 위해서라도 기차운전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데요.
도통 말을 하지 않던 남편이 어느 날은 사고를 당한 유가족만 생각하면 미쳐버릴 것 같다며 펑펑 울은 날이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사고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만 했지 남편이 사고를 당한 사람을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가장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처지일까를 남편의 울음 속에서 문득 깨달았으니까요.
남편은 사고 이후 하루도 결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라며 동료들은 기운 내고 일하라고 위로도 해주고 친한 이는 손 씻어 준다고 소주도 사주고 하면서 여태껏 버티고 있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웃다보니 이제 웃는 일이 익숙해졌다며 잠도 잘 잡니다. 밥도 그런 대로 먹지만 요새는 오줌에서 빨간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하고, 가끔씩 잠에서 깨면 속옷이 행주처럼 젖어 있기는 하지만 어쩌겠어요.
'사는 게 정말 이런 거구나 '싶은 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싶데요. 이보다 험한 일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하던 일을 멈출 수는 없지 않겠어요? 요새 같아서는 어쨌거나 살아내야 합니다. 기운을 차려야지요. 일은 남편 몰래 친정엄마 약값 보내려고 모아둔 돈을 찾아서 보약이라도 한재 지어야겠어요.
<조혜영 삶이 보이는 창 8호에서 발췌>
저의 남편은 아침저녁 밤낮 구분 없이 일을 하는 철도 기관사인데요. 두 달이 채 못 되어 사고를 두 번 냈지 뭐예요. 한번은 만취한 어느 실직자였는데 서울역을 눈앞에 두고 달리는데 검은 그림자의 사내가 비틀대며 걸어오더랍니다. 막차를 몰고 자정이 넘어 '이제 끝나 쉴 수 있겠구나' 하며 여유 있게 역으로 들어오던 참인데, 그런데요. 기차길 한가운데로 비틀대며 걸어오던 사람이 비켜서지를 않더랍니다.
어쩌겠습니까. 쇠 바퀴로 받고 달려갈 수 밖에요. 기차란 게 그런 거랍니다. 브레이크를 잡아도 쉽게 멈출 줄 모르고, 차에 한번 받쳤다하면 사람이고 뭣이고 성할 수가 없다나 봐요. 오죽했겠어요. 그것도 자살할 마음으로 기차에 덤벼들었으니.
또 한번은 영등포를 출발하여 새벽기차를 몰고 가던 참이었는데요. 안개가 자욱했던 날이었었나 봐요. 새벽 6시가 좀 못되었는데 안개까지 끼어 정신을 놓을 수가 없었던 그날은 머리가 쭈뼛쭈뼛 솟고, 식은땀이 속옷을 적실 정도로 긴장이 되더랍니다. 왜 아니겠어요. 며칠 전에도 그 끔찍한 사상사고를 냈고 직접 시체를 치우고 뒤틀리고, 잘려나간 가슴의 주머니를 뒤져 신분을 확인하는 일까지 손수 마쳐야 했으니 밥도 제대로 못 먹던 때였는데요.
그런데 그 날은 새벽일을 하기 위해 기찻길을 가로질러 건너가던 공사장 인부였었나 봐요. 그 사람은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게 그만 기차길 중간에서 한발자국도 못 움직인 채 기차 속으로 묻혀 들어가 피범벅이 되었더랍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지만 기관사실 안에서 "야 야 임마 비켜! 한 발짝만 비켜서란 말야" 하고 소리친들 들렸겠습니까? 급히 차를 정차해놓고 내려가 보니 한 50미터는 쇠 바퀴에 깔렸더랍니다.
온몸이 조각나 얼굴이 어디고 다리가 어딘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처참했다지 뭐예요. 겨우 주머니를 뒤져 신분을 확인해 보니 58년 생 두 아이의 가장이더랍니다. 서른아홉 살인 남편은 다시 기관차를 몰고 목적지로 행했는데 정말 더러운 게 인생이더랍니다. 남편은 이 짓을 더 해야 되냐며 울부짖었습니다. 다시는 이 두 손으로 시체를 치우고 싶지 않다며 손을 부르르 떨었지요. 밤새 술을 푸고 뻘겋게 충혈 된 눈으로 다시 출근해 기차를 몰고 다시 울부짖고… 몇 날을 그렇게 보냈지요.
IMF, IMF 해도 우리 집은 그나마 일자리가 있어 다행이라고 여기며 지내왔지만 더 이상 남편을 일터로 나가라고 할 수가 없었지요. '설마 굶어 죽기야 하겠냐 싶어 몸 좀 추스린 다음 영 안 되면 시골에 내려가자'며 달랬습니다. 저는 남편이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았어요. 저러다가 정신이 돌아버리는 건 아닌가, 어떤 기관사는 사고 후유증으로 며칠을 아무 말 없이 지내다가 넥타이로 목을 매 자살을 했다는데, 오랜 동기인 어떤 기관사는 아직도 정신병원에 있다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뭐예요.
남편으로 인해 숨져간 사람들을 생각할 틈도 없이 하루하루 버티는 남편을 바라보는 것도 힘들고 벅찼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일밖에 모르며 살아온 남편인데, 나이 마흔도 안 되어 닥친 시련을 어찌해야 되나 절망스러웠지만 어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같이 술을 마셔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매만져 주고…
결혼 10년에 처음으로 부부란 게 이런 건가 싶데요. 내가 아니면 누가 저 고통을 나눌 수 있겠나 싶기도 하구요.
그 동안 10년 가까이 기관사 일로 밤낮없이 출근하고, 한겨울이 되면 무쇠덩이의 기관차가 꽁꽁 얼어붙어 손이 쩍쩍 달라붙고 콧물을 흘리면 콧물이 고드름으로 변해 고드름을 코에 매달고 달리고, 삼십 도를 오르내리는 한여름이 되면 기관차는 사 오십 도도 넘어 기관차에 달걀 후라이를 해먹어도 될 정도로 뜨거운 기관차 안에서 여름을 보내고 소금기에 절은 속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일하며 사우나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기관사실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며 웃기도 하던 남편이었지요.
어떤 때는 대소변을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 달리는 기관차 안에서 해결하기도 하고 제때에 밥을 못 먹어 늘 가방에는 소화제니, 위장약을 과자처럼 넣고 다니지만 여태껏 일해 온 나날이 두 번의 사고가 사람을 하루아침에 절망 속으로 빠뜨리는구나 생각하니 화병이 날 것만 같았지요.
며칠을 말 한마디 없이 지내던 남편이 한번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녀석을 위해서라도 기관사일을 멈출 수 없다'며 웃음을 짓지 뭐예요. 기관사보다 대통령이 더 좋은 사람이라며 놀려도 여태껏 변함없이 기관사가 꿈인 아들한테만큼은 멋진 기관사 아빠이고 싶다며 애를 위해서라도 기차운전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데요.
도통 말을 하지 않던 남편이 어느 날은 사고를 당한 유가족만 생각하면 미쳐버릴 것 같다며 펑펑 울은 날이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사고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만 했지 남편이 사고를 당한 사람을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가장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처지일까를 남편의 울음 속에서 문득 깨달았으니까요.
남편은 사고 이후 하루도 결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라며 동료들은 기운 내고 일하라고 위로도 해주고 친한 이는 손 씻어 준다고 소주도 사주고 하면서 여태껏 버티고 있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웃다보니 이제 웃는 일이 익숙해졌다며 잠도 잘 잡니다. 밥도 그런 대로 먹지만 요새는 오줌에서 빨간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하고, 가끔씩 잠에서 깨면 속옷이 행주처럼 젖어 있기는 하지만 어쩌겠어요.
'사는 게 정말 이런 거구나 '싶은 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싶데요. 이보다 험한 일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하던 일을 멈출 수는 없지 않겠어요? 요새 같아서는 어쨌거나 살아내야 합니다. 기운을 차려야지요. 일은 남편 몰래 친정엄마 약값 보내려고 모아둔 돈을 찾아서 보약이라도 한재 지어야겠어요.
<조혜영 삶이 보이는 창 8호에서 발췌>
전체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