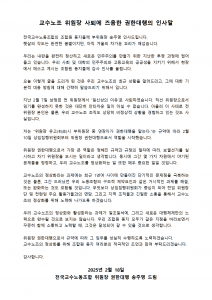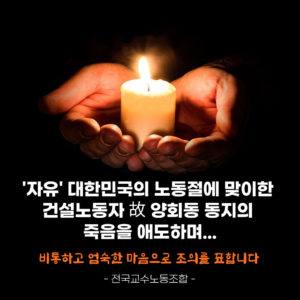[교수논평2024-09] ‘빅 블러(Big Blur)와 무전공제의 오·남용’
[교수논평]은 2020년 10월 첫 발행을 시작으로 매월 1주와 3주에 대학민주화와 고등교육 개혁의 주체로서 올바른 교육·대학·사회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기 발행되어 왔습니다. 2024년부터 [교수논평]은 이 시대의 사회 이슈와 교육 현안 등에 대해 전문 논평인들의 논평을 격주에 발간합니다.
'빅 블러(Big Blur)와 무전공제의 오·남용'
홍성학 (전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명예교수)
교육부는 지난 1월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육성사업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으로 ‘25학년도 모집단계 혁신성과’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모집단계 혁신성과로 전공 없이 입학하는 무전공제 입학생 비율이 25% 이상 되도록 하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성과 평과 결과에 따라 성과급(인센티브)을 부여하겠다고 하였다.
교육부의 무전공제 발표 이후 무전공제의 비효과성과 부작용, 그리고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독선·불통 행정 등과 관련해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비판에 덧붙여 ‘빅 블러’와 ‘무전공제’ 등 용어 사용의 오·남용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빅 블러(Big Blur)’ 용어의 오·남용이다. 교육부는 무전공제 사업 취지로 ‘학문 간,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 블러(Big Blur)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융합인재 양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사업 취지 내용에서 ‘빅 블러’를 시류에 편승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는 점, ‘빅 블러’ 용어 사용이 시점상 부적합하다는 점, 융합과 항상 연결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점 등이 ‘빅 블러’ 용어의 오·남용을 부추겼다.
첫 번째로 ‘빅 블러’를 시류에 편승하는 용어로 사용한 점이다. 이러한 용어 사용은 빅 블러 시대 이전에는 융합인재 양성이 필요 없었던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또한 사업 취지에서 ‘빅 블러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이라고 하여 빅 블러 시대를 당연시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문·연구의 비판적 사고를 훼손시킬 수 있다. ‘빅 블러’, ‘빅 블러 시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이전에도 대학 현장에서는 ‘다학문적’, ‘학제간(學際間, Interdisciplinarity) 교육과 연구’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융합인재 양성과 연구를 계속 강조했었다. 그리고 시대 흐름과 관련하여 다양한 접근과 분석·연구가 있었다.
두 번째로 시점상 부적합하다는 점이다. ‘블러’와 ‘빅 블러’ 용어가 사용된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 ‘빅 블러’ 용어 이전에 ‘블러’라는 용어가 먼저 사용되었는데, 스탠 데이비스(Stan Davis)와 크리스토퍼 메이어(Christoper Meyer)는 1998년 ‘블러: 연결된 경제에서의 변화 속도’라는 저서를 내고 ‘블러’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블러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출간되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13년에 조용호는 ‘당신이 알던 모든 경계가 사라진다’는 저서에서 ‘빅 블러’라는 용어를 처음 소개했다. 2013년으로부터 다시 11년이 지나 경제·산업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시점에 교육부는 ‘빅 블러 시대’와 급속한 경제·산업 변화로 인한 미스매치에 대비하기 위해 융합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올해 들어 ‘빅 블러 시대’를 내세우며 융합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 시점상 적합한지, 그리고 그동안 교육부는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로 ‘빅 블러’가 ‘융합’이라는 용어와 항상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는 점이다. ‘빅 블러’라는 용어를 처음 소개한 조용호는 자신의 저서에서 빅 블러를 ‘경계 융화’라고 하면서 ‘두 요소들 사이에 명확하게 존재해 왔던 경계가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변화’라고 하여 다른 종류의 것이 합쳐져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융합과 구별하였다.
조용호는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여 새로운 가족 형태를 만드는 것을 융합이라고 하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개별적 특성을 닮아가는 것, 어울리는 것을 융화라고 하였다. 융합은 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나노기술 등을 결합하거나 디자인·비즈니스·과학기술 등 서로 다른 분야를 통합하는 형태이고, 융화는 소비자가 생산자의 영역에서, 생산자가 소비자의 영역에서 역할하는 것처럼 자기 영역이라고 설정했던 영역을 넘어 역할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융화는 융합과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 별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빅 블러’가 ‘융합’과 항상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융합인재 양성이 목적이라면 ‘빅 블러’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상 ‘빅 블러’ 용어의 오·남용을 지적했는데, 이와 더불어 ‘무전공제’ 용어의 오·남용 역시 경계해야 한다. 교육부는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무전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무전공제 도입을 강제하고 있지만, 무전공제는 융합인재 양성 수단의 하나이지 전부가 아니다. 그러나 ‘무전공제’ 도입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무전공제’ 도입이 목적인 것으로 보일 정도이다. 교육부는 성과(out put) 평가에 초점을 두겠다고 하였으면서, 융합인재 양성 결과를 평가하기 보다는 무전공제 도입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학 현장에서는 ‘무전공제’ 용어를 특정 인기학과로의 쏠림을 부추기고 기초학문을 비롯해서 다양한 학문과 학과를 파괴시켜 융합인재 양성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의 상징 용어로 받아들이고 비판하고 있다. 학과 간 벽을 허무는 경계 융화와 다양한 학문 융합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다양한 학과가 존재하고, 기초학문이 존재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융합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두면서 ‘빅 블러’와 ‘무전공제’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오·남용한 것을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빅 블러’와 ‘무전공제’ 용어의 오·남용이 융합인재 양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동안 융합인재 양성 정책을 제대로 했는지, 어떤 점이 미흡했는지 등 먼저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제를 찾아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끝)